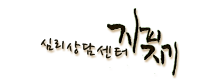- 2025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 안내(의정부) 2024.12.30
- 발달지연 영유아 국가지원 종합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아동지원팀] 2024.11.26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정기관 2024.07.12
- 미술심리상담사 [전문가 취득집중수련] 참가 신청 안내 2024.03.14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2024.03.07
- 2024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의정부시) 2024.02.01
- 2024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안내 (남양주시) 2024.02.01
- 24년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안내 2024.01.26
- 2024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안내 (의정부시) 2023.12.27
- 2023년 노인 맞춤형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 (의정부시) 2023.10.24
- 2023년 노인 맞춤형정서지원 바우처 추가 모집안내 (의정부시) 2023.06.29
- 2023년 노인 맞춤형정서지원 바우처 안내 (의정부시) 2023.03.02
- 2023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안내 (남양주시) 2023.02.02
- 여성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2023.01.07
- 2023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안내 (양주시) 2023.01.05
- 2023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안내 (의정부시) 2023.01.02
-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모집안내 (양주시) 2022.06.11
- 2022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안내 (남양주시) 2022.01.21
- 2022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안내 (양주시) 2022.01.06
- 2022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모집안내 (의정부시) 2021.12.28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과정 모집안내 2021.05.12
- 의정부시_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모집 안내 2021.05.12
- 미술심리 2급 자격증 과정 모집 2021.05.12
-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바우처 모집안내 - 남양주 2021.01.25
- 2021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모집안내 _ 남양주시 2021.01.25
-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바우처 모집 안내_의정부 2021.01.21
- 2021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모집안내 _ 양주시 2021.01.16
- 프라임헤럴드 기사 _ 나를 알고 너를 알며 상처 치유하는 공간 2021.01.08
- 2021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모집안내 _ 의정부 2020.12.18
- 경복대학교와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협약 2020.11.27
- 녹색경제신문 : 메이팜소프트-지피지기심리상담센터, 인공지능기반 ‘.. 2020.06.12
- 꿈e든 카드 지정 기관 2020.05.22
- 2020년 함께하는 심리여행 꿈의학교 모집 안내 2020.04.08
- 센터 휴원 안내입니다. 2020.02.26
- 코로나19 예방수칙 2020.02.25
- 2020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모집안내 _ 포천시 2020.02.06
- 2020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모집안내 _ 남양주시 2020.01.28
- 2020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모집 안내 - 양주시 2020.01.17
- 2020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모집안내 _ 동두천시 2020.01.10
- 미국 시애틀 타코마 꿈나무 한국학교 _ 감사장 2020.01.04
- 2020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모집 안내 _ 의정부 2019.12.23
- 의정부 꿈의학교 성장발표회 2019.11.30
- 2019년 한국중독상담학회 추계 학술대회 안내 2019.10.21
- 꿈길 _ 나를 알아가는 신나고 재미있는 여행 2019.10.12
- 의정부시, 남양주 화도읍 가을 축제 취소 안내 2019.09.30
- 의정부시, 남양주 화도읍 가을 축제 안내 2019.09.23
- 2019년 2학기 경기 꿈의대학 개강 안내 2019.09.16
- 2019년 함께하는 심리여행 꿈의학교를 마치며 2019.09.06
- 2019년도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이용자 추가 모집 2019.08.01
- 하남 이마트 _ 심리상담 2급반 개설 및 특강 안내 2019.07.23
- 자격증 과정 _ 미술 1급 / 심리상담 1급 안내 2019.07.12
- 지피지기 소장님과 두 부소장님 미국 시애틀 한글 학교 교육. 2019.07.10
-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 의정부 하반기 모집 안내 2019.07.03
- 미술 심리상담사 1급 임상 일지 안내입니다. 2019.07.03
- 의정부 지방법원 _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족장 2019.04.22
- 2019년 함께하는 심리여행_꿈의학교 학생 모집 2019.04.09
- 2019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남양주시 모집 2019.01.28
- 2019년 지피지기 자격증과정 수시 모집 2019.01.01
- 2019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의정부 모집 2018.12.26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우수 이용후기 공모전 2018.09.27
- 9월 새학기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과정반 모집 2018.08.22
- 이마트 문화센터 하남점 모집광고 2018.07.23
- 가평 교육지원청 교육자원보사자 연수 강의 2018.07.23
- 서울사이버대학교 _ 미술심리상담사 2급 강좌 안내 2018.07.04
- 찾아가는 지피지기 꿈의 학교 _서울대 탐방 1 2018.06.12
- 찾아가는 지피지기 꿈의 학교 _서울대 탐방 2 2018.06.12
- 00학교 교사 연수 집단 활동 2018.06.08
- 서울 사이버 대학교 _ 군상담 토론.. 2018.06.06
- 경기 꿈의학교 '찾아가는 지피지기'가 개교식을 했습니다. 2018.05.16
- 삼육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집단 활동 프로그램 진행 2018.04.24
- 경기 꿈의 학교 학생 모집 안내... 2018.04.11
- 미술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과정 개강안내입니다. 2018.04.05
- 2018년 1학기 경기 꿈의 대학 안내 2018.03.08
- 경기 꿈의 대학(삼육대) _ 연극놀이를 통한 동화속 인물의 현대적 심.. 2018.03.06
- 경기 꿈의 대학 (대진대) _ 너와 나를 위한 행복한 대화법 2018.03.06
- 경기 꿈의 대학 (대진대) _ 북 앤 아트 셀프 테라피 2018.03.06
- 경기 꿈의 대학 (대진대) _ 동화구연을 통한 등장인물의 심리분석 ... 2018.03.06
- 토요집단 활동 무료 체험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18.03.06
- 경기 꿈의 대학 (대진대) _ 그림으로 소통하는 관계심리학 2018.03.06
- 경기 꿈의 대학 (대진대) _ 심리기법을 통한 자기 이해와 관계 이해 2018.03.06
- 경기 꿈의 대학(삼육대) _ 현대 심리학으로 분석하는 ..... 2018.03.05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반 문화센터 강의 개설안내입니다. 2018.02.26
- 연천군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접수 안내 입니다. 2018.02.12
-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바우처 지정 상담소로 선정 되었습니다. 2018.02.08
- 동두천시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접수 안내 입니다. 2018.02.06
- 포천시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접수 안내 입니다. 2018.01.24
- 남양주시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접수 안내 2018.01.22
- 양주시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접수 안내 2018.01.16
- 20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문강사 선정 2018.01.12
- 의정부시 [우리아이 심리지원 바우처] 접수 안내 2017.12.27
- 대진대 평생교육원 수업이 개강하였습니다. 2017.12.20
- 초등학생, 중학생 토요집단반 모집안내 2017.10.25
- 미술상담사 1급,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과정 개강 2017.10.13
- "그림으로 치유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 파주타임스 기사 2017.09.09
- 이마트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과정 2017.09.09
- 신내동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그림검사 진행.. 2017.08.18
- 2017년 제2차 지피지기 전체 워크숍 안내 2017.07.17
- 파주 1사단 아동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과정 2017.05.26
- 삼육대학교 학생 대상 자격증 특별과정 2017.05.26
- 연천 군가족 대상 자격증 과정 2017.05.26
- 선*초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2017.05.17
- 소흘도서관(포천) 미술심리2급자격증 과정 모집... 2017.05.16
- 2017년 제1차 지피지기 전체 워크숍 2017.04.11
- 2017년 지피지기 자격증 과정 2017.03.02
- 2015년 9월 12일 (토) 포천 평생 학습 축전 2015.09.07
- 대진통일포럼(최신군상담기법의 실제) 2015.05.18
- 지피지기심리상담연구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5.02.07
예전에 한 여성 연예인이 주민등록 나이보다 한참 낮은 나이를 밝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실이 확인된 후 그녀가 했던 통한 어린 언론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인기를 위해 나이를 속이긴 했는데, 분장실에선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많았다는 것. 자신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맞먹고, 심지어 어리다고 반말을 할 때마다 ‘내가 언니인데’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았다는 내용이었다.
 |
우리말의 호칭은 참 다양하다. 그 호칭을 통해 상대의 존재감, 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가 나를 부르는 호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호칭 하면 늘 떠오르는 경험담이 있다.
예전에 내가 신문사에서 일할 때의 일이다. 신문사는 직급이 다양하지 않아 평기자·차장·부장·국장 정도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직급에선 입사 연차에 따라 “선배” “후배”로 부르는 게 보통이다. 문제는 남자기자 후배와 여자기자 선배 간의 미묘함에서 발생했다. 남자는 군대 갔다오고, 재수해 나이가 늙수그레(?)한 데 비해 나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문사로 직행해 신문사 밥을 먹은 지 몇 년, 당연히 경력면에서 남자기자의 선배였다.
하지만 그 남자기자는 나이가 먹었다는 오기에 대강 호칭을 생략하며 두루뭉술 넘어갔다. 평상시 대화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올 때였다. 전화가 왔다고 알려야 하는데 남자기자가 선배란 호칭을 뗀 채 이름을 불러 버린 것. 화가 난 나는 옥상으로 불러 올려 주의를 줬지만 결국 그 이후로 그와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말았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호칭은 우리 사회 가치관의 지표다. 예전엔 모르는 남자행인을 “선생님” 하고 불렀지만 요즘은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예전엔 먼저 태어난 것으로 표현되는 학식을 중요시했지만, 점차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호칭도 변한 것이 아닐까. 요컨대 호칭만 잘 불러도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우선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라.
사회생활을 하며 질문의 힘은 곳곳에서 실감하는데 호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레 맘대로 불렀다가는 본인은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혼다그룹의 혼다 소이치로는 부하직원들이 “사장”이라 부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그보다는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업체에서 친근감을 담아 붙이던 “오야지(おやじ·親父)”란 호칭을 선호했다. 호칭은 부르는 사람도 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맘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호칭을 불러 주라.
둘째, 덤 듬뿍 작전을 쓰라.
택시나 버스를 탔을 때 “아저씨” 하고 부르는 것과 “기사님” 하고 부를 때의 차이점을 느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승진을 했는데도 자신의 입에 젖었다는 이유만으로 꼭 예전의 직급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이가 있다. 가령 전무로 승진했는데 예전에 상무일 때 모셨다고 자꾸 그 시절 호칭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둔감함을 넘어, 저의까지 의심받을지도 모른다. 은퇴한 분이라면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올랐던 최고의 지위에 준해 호칭을 부르라. 인심 좋은 호칭이 인간관계에 행운을 불러온다.
셋째, 호칭에 친밀함을 담아라.
내가 모 중년 여배우를 인터뷰할 때 일이다. 그녀는 자신과 친한 노년 여배우를 칭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P밖에 안 계십니다. P는 그만큼 제가 존경하며 따르는 분이랍니다.”
모두에게 덥석덥석 형님, 언니 하며 엉기는 것은 꼴불견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너서클(inner circle) 멤버라면 호칭을 차별화해 친밀함을 담을 필요가 있다. 남과 다르게 특별 대우받는 것을 느낀 상대 역시 당신을 특별하게 대할 것이다.
친밀도가 호칭을 통해 적절히 표현될 때 한 울타리 사람으로 한층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자, 단순한 호칭에도 이처럼 복잡미묘한 인간심리가 자리하고 있다. 잊지 마시라. 호칭의 강력한 힘을!!